


|

|
 |
2
본세기 20년대와 30년대에 중국으로 망명한 조선혁명자들의 대부분이 최초에는 블랑키의 사이비한 후예—테로분자들이였다. 그들은 거의 종교적인 열광으로 테로활동을 숭상하였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소수 융사들의 모험적인 행동으로 능히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적통치를 뒤엎을수 있다고 굳게 믿었고 망국의 치욕을 자기들의 피로써 능히 씻을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하여 그들은 적의 요인들을 암살하고 특무와 반역자들을 처단하는것을 자기들의 주요한 행동강령으로 삼았다. 그들의 가슴속에서 불타는 적개심은 그들에게 환락과 아울러 비극을 가져다주었다. 다음에 서술하는 리강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비극의 한 례증이다.
한번은 로련한 테로분자 즉 독립투사 둘이 특무놈을 처단하러 가는데 신인을 육성할 목적으로 견습생 하나를 데리고 갔다. 그 견습생이 바로 혁명에 갓 참가한 리강동무였다. 리강의 두 테로선배는 잡아치울 희생물—신세를 조진 특무놈—을 옴짝 못하게 량쪽에서 꽉 붙들고는 리강에게 명령하였다.
“어서 이리 와. 그 권총의 안전기를 열어! 요놈의 대가리를 겨누고… 아니야, 총구멍을 바싹 들이대! 옳지, 쏴라! 겁내지 말아!”
리강은 겁이 나서 죽을 지경이였으나 명령을 거역할수가 없어서 마지못해 시키는대로 하였다. 그 결과 그는 온몸에 선지피를 뒤집어썼다. 코를 거스르는 피비린내에 걷잡을수없이 구역질을 하였다. 그때부터 우리의 가엾은 리강은 거의 종신병환자가 되고말았다.
달마다 같이 생활비만 나오면 그는 의례 거리에 나가서 다홍색물감을 사다가는 자기의 안팎옷들과 침대보 수건 따위에 몽땅 물을 들였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마당에 내다널고 짜지 않은 빨래에서 다홍물이 피물처럼 들게 하였다. 그런 다음 걸상을 내다놓고 앉아서 그것들을 흡족한 마음으로 바라보는것이다. 그의 그렇듯 해괴한 거동은 달마다 되풀이되고 또 해마다 되풀이되였다.
이밖에 또 그는 매일 아침 식사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식사중인 일동에게 자기의 그날 갈기로 한 새 이름을 통보하였다. 그것은 마치 군대의 통행암호처럼 날마다 갈릴뿐아니라 결코 또 중복되는 일도 없었다. 리강은 본시 붓글씨를 쓰는데 뛰여난 재간을 가지고있었다. 하여 우리는 무엇을 쓸 때면 늘 그의 손을 빌군 하였다. 허나 함부로 엄벙덤벙 찾아가서
“이봐 리강, 나 뭐 하나 좀 써줘야겠어.”
했다가는 락자없이 코빵을 맞는다. 그는 찾아온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오직 그날의 새 이름을 부를 경우라야만 상냥하게 그 사람의 청을 들어준다. 그래서 누구나 그에게 무엇을 부탁하려면 먼저 돌아다니며 그의 그날 새로 간 이름부터 수소문해야 하였다.
력사도 때로는 곧잘 울도웃도 못할 지꿎은 장난을 한다. 이 세상에는 벌써 혁명에 성공한 경험이 있건만 후래자들은 흔히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름길을 걸으려고 애를 쓴다. 왕왕 적지 않은 민족들이 전철을 밟으면서 선진민족들이 이미 경과한 유치한 계몽계단을 되풀이하느라고 비싼 대가들을 치르군 한다.
또 다른 한 례로서는 장지광의 경우를 들수 있다. 장지광은 북미합중국 개발시기 미국에 이주한 조선인의 제2세로서 하와이태생이다. 후에 그는 그 홀어머니를 따라 중국으로 건너와서 상해 프랑스조계에 정착하였다. 열여덟살이 되던 해에 그는 의렬단이라는 조선인반일테로단체를 위해서 활동경비를 조달하는데 마침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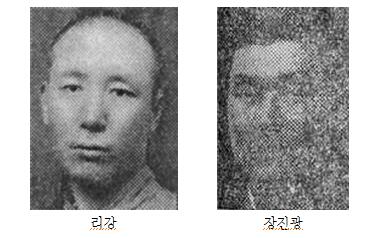 |
|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
